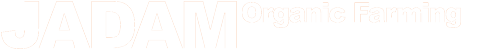강헌(대중음악평론가)
|
“오늘 아침, 싸이가 빌보드 차트에서 2위를 했습니다. 문화산업의 맹주인 미국에서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제일 먼 35살의 아저씨 싸이가 2위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역사는 1926년 8월 4일, 김우진과 윤심덕이 동반 자살하면서 그 뒤에 나온 '사의찬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926년에 미국에서는 상원 의회의 허버트 후버라는 상무부 장관이 헐리우드 영화산업진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요.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영화산업, 음반산업, 방송산업 같은 문화산업은 미합중국의 ‘국가기관산업’이다. 그래서 미합중국은 도로, 항만, 전기, 가스 공사처럼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 해야 된다. 이유는 이 자체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치를 세계에 펼치고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적 무기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산업이라는 인식을 한 또 하나의 국가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을 가진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도 문화가 국가기반산업이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1960년대 중반 도쿄 올림픽 전후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40년 늦었죠. 그럼 대한민국이 문화가 국가산업은 고사하고, 산업이라고 인식한 최초의 순간은 90년대 중반입니다. 그전까진 문화산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사회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30년, 미국보다 70년 늦었습니다. 그나마 행정부의 수장이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 생각한 계기도 저열한 수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현대자동차를 해외 수출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더니 그 해 미국이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로 번 수입의 절반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때 청와대가 충격을 받았죠. 그전까지 영화, 대중음악 같은 문화산업은 한국사회 파워엘리트들한테 지원과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었어요.” 서태지 팬들은 서태지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세대
“그러다가 90년대 서태지 시대에 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판계에서만 쓰던 밀리언셀러라는 말이 음반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음반시장에 규모와 수준에서, 음반 한 장이 100만 장 팔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나 정책이라던가 체제가 완비되기 전에 소비영역에서 빅뱅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태지는 그냥 스타가 아니에요. 서태지는 90년대 한국 사회의 성격들을 요약 집약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90년대를 이렇게 만들었나를 봅시다. 80년대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대학 나와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고 외치던 이 시대가 동구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혁명의 담론은 90년대 초반 3년 사이에 빛의 속도로 퇴각하게 됩니다. 마치 70년대 초반의 일본의 전공투(전학공투회의)세대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른바 일류 대학 출신의 운동권들이 갈 데가 없어진 것이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이 극점이었던 60년대의 미국과 70년대 일본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혁명을 겪었던 청년 엘리트들이 결국 혁명가이기를 포기하고 가장 많이 간 곳이 문화의 영역인 것이죠. 한국도 이런 길을 겪으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담론이 만들어진다고 현실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현실을 이동하게 하는 것은 최대의 저변을 이루는 대중이 움직일 때입니다. 90년대 새로운 대중, 이른바 '신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출현합니다. 80년대 초에 태어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컬러방송을 보고 자란 첫 번째 세대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이전 세대와 완전히 구분됩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전의 라디오와 흑백TV 세대들이 모든 개념을 메시지적으로 사유한다면, 컬러방송 시대의 세례를 받고 자란 세대는 모든 것을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구체적이고 산문적인 상상력을 지닌, 이미지 시대의 새로운 대중이 출현합니다.
|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96년 8월 한 달 동안에 신인댄스그룹이 100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0팀 중에서 3개월 뒤에 살아남은 게 H.O.T랑 영턱스클럽 2팀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98팀을 만든 제작비는 전부 회수될 수 없는 돈으로 끝나는 거에요. 극소수의 생존자만 남기고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게임이 시작되었고, 2년 뒤에 IMF가 터지면서 거품이던 음반산업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이 새로운 어떤 전환의 기회와 계기를 줍니다. 바로 중국에서 한류라는 개념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 북경 상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북산성의 연길, 장촌에서도 한국노래가 들렸어요. 아이돌 그룹도 아니고 윤도현 밴드의 노래들이.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지불한 저작권료가 1년 동안 고작 5200만원이었어요. 그런 중국에서는 실제 당시 한류라는 게 상업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던 거에요.
|
그럼 싸이는 어떻게 세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동안 한류 문화 인프라가 깔린 후 결정적으로 SNS가 사고를 칩니다. 그전까지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정도에서 한류 붐이었다면, 싸이가 유일한 섬으로 남았던 미국을 두 달 만에 점령한 것이죠. 싸이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가 한국의 메이저 상품이었던 아이돌 그룹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미국시장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미국 시장에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남스타일을 영어로 부른 것도 아닌데, 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성공하고 나서 하는 말이야 누구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싸이의 성공이 만든 효과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시장은 난공불락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진출했었어요. YG패밀리의 세븐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 다음이 보아였고, 수많은 가수들이 실패를 맞봐야 했습니다. 결국 통한 것이 JYP의 원더걸스였지만 간신히 HOT100차트에 진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싸이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수많은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있겠죠. 싸이의 노래가 메인 차트에 2위까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메이저리그 입장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싸이가 2등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스틴 비버가 소속된 매니지먼트랑 계약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국 콘텐츠가 드디어 시장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트렌드의 급격한 교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특히 중국의 경우 처럼 반한류와 혐한류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문화가 상품이지만 동시에 문화이기 때문에 소통과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문화를 재미있어하고 받아 들일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화는 가전제품과 달라서 감정이 담겨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은 고장 안 나고 예쁘면 되지만, 민족감정이 담긴 상품들은 위험해 집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의 가장 큰 덕목은 '관용'이었습니다. 문화 교류에서도 한류에 열광하기 이전에 다른 문화에 대해 열려 있는 감성과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류의 지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강연일: 2012년 9월 27일 나눔 문화 : http://www.nanum.com
기사입력시간 : 2012-10-06 13:30:01
제공:나눔문화, 다른기사보기<저작권자 © 자닮,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눔문화